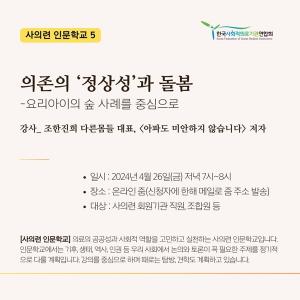'소수자를 위한 의료'를 생각한다
백재중
현대 의학은 ‘젊은 남성’의 신체를 ‘정상’으로 간주하고 이를 표준으로 삼아 구성되었다. 의학적 개념의 도출, 진단과 치료 가이드 라인의 설정도 여기에 맞춰져 있다.
이러한 표준 설정은 심각한 오류를 남긴다. ‘젊은 남성’의 기준을 벗어 나는 경우 질병 상태로 규정하고 치료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는 점이다. 노화에 따른 신체 변화를 바라보는 의학의 관점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르면 노화 자체는 병적 과정으로 간주되며 마찬가지로 치료의 대상으로 여겨진다.
여성은 남성의 변형태, 어린이는 성인 남성의 축소판 정도로 취급되며 장애인은 정상성이 결핍된 존재일 뿐이다.
‘젊은 남성’의 정상성은 젠더 문제에서는 ‘양성애자’라는 기준에 고착된다. 따라서 ‘정상적인’ 양성애자가 아닌 성소수자는 환자이며 치료 대상이다.
의료는 국민국가라는 경계 안에서 작동한다. ‘국민’만이 정상적인 의료의 대상이고, 이주민, 난민 등의 외부인은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들에 대한 의료는 손실로 처리된다.
 |
의료는 ‘정상성’이라는 표준을 내세워 소수자를 ‘비정상’으로 재단하며 소수자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이런 면에서 의료 권력은 사회 권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오히려 의학은 ‘정상성 모델’을 내세워 소수자 배제의 첨병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우생학에 기반한 의료가 대표적이다. 나치의학의 기반이 되었던 우생학은 소수자에 대한 최소한의 온정주의 조차 버리고 이들을 배제하고 제거하는데 진력을 다했다. 한센병 환자를 소록도에 가두고 강제 불임 시술을 자행했던 일제 의료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의료가 치유의 수단이 아닌 관리, 통제의 수단으로 전락할수 있음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무수히 목격한다.
지금도 시설에 강제입원 당해 갇혀 있는 정신장애인들이 수만 명에 이른다. 지난 지방 선거에서 동성애 치료센터 설립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도 있었다.
1973년 이탈리아 북부 산지오바니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던 정신장애인들은 자신들이 제작한 ‘마르코 까발로’라는 큰 목마를 이끌고 병원을 나와 시가지를 행진한다. 이 퍼레이드에는 정신병원의 의료진들과 시민들도 참여한다. 그들에게는 의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자유’가 필요했다.
지금 의료의 ‘치유성’ 회복을 위해 진지한 성찰이 요구된다. 지난 주말의 퀴어 퍼레이드를 계기로 ‘소수자를 위한 새로운 의료’가 모색되기를 희망한다. 온정주의에서 더 나가 소수자 자신이 ‘표준’이 되는 의료가 필요하다.
백재중 jjbaik9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