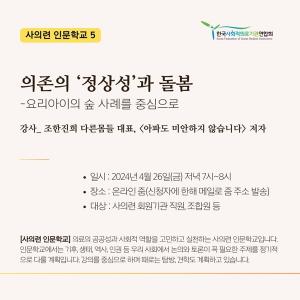- 대한민국 정신장애인 수난사
이 책은 이탈리아 정신보건 혁명에 관한 책, 『자유가 치료다』 저자가 우리나라 정신장애인 수난의 역사와 현실에 대해 기술한 책이다. 구미 여러 나라의 경우 이미 1970~80년대 탈시설화를 이루어 지역사회 정신보건이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으나 우리나라 정신보건은 한참 뒤쳐져 있다. 여전히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장기 입원해 있는 경우가 많다.
 |
코로나19 팬데믹의 과정에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정신장애인의 감염과 희생이 유난히 컸다. 이는 폐쇄되고 환기가 안 되는 조건에서 많은 사람이 밀접하게 지내야 하는 생활 환경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던, 사회 관심 밖에 놓여 있던 정신장애인의 현실이 코로나19 유행으로 그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현실은 어제 오늘이 아니라 오랜 과거부터 계속 이어져 온 수난의 결과이다.
지난 100년, 근현대 우리 역사에서 정신장애인이 자리할 공간은 없었다. 일제 강점기 정신장애인 관리는 식민 지배의 일환으로 시작해 시대의 흐름이었던 우생학의 강력한 영향 아래 놓였다. 혐오와 낙인, 이를 잇는 차별과 배제는 이들을 사회로부터 분리시키기 시작했고 급기야 시설에 가두기 시작했다. 변두리 존재였던 부랑인들과 뒤엉킨 정신장애인 잔혹사는 우리 역사에 어두운 그림자를 남겼다.
해방 후에도 이들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 전쟁을 거치고 군사 독재가 지배하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신장애인들은 무허가 기도원과 정신 요양원에 갇혀 폭력을 견뎌야 했다. 이들을 위한 법률은 없었다. 1995년 비로소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후에는 정신병원이라는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해 갔을 뿐 사회로부터 분리된 신분이 달라지지 않는다.
지난 과거는 정신장애인에게 수난의 역사였고 그 수난은 지금도 계속된다. 아마 당분간은 희망이 없을지도 모른다. 종교도, 사회복지도, 의료도 모두 이들을 외면했다.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격리와 수용 그리고 갇힌 공간에서 자행된 폭력이었다. 굶기고 구타당하고, 독방에 감금당하기 일쑤였다. 그러다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국가는 이들의 수난을 조장하거나 방치하였다. 이들의 문제가 제도 안에서 논의되는 걸 막았고 법률 제정을 저지했다. 우리 사회 정신장애인은 국가가 책임질 대상이 아니라고 여겼다. 제도와 정책에서 사라진 그들은 어두운 장막 뒤에서 신음해야 했다. 법에서 다룰 가치조차 없는 존재였던 정신장애인은 해방 후 5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법의 대상으로 편입된다.
1995년 어렵게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고서야 사회적 존재로 인정받지만 격리, 수용이라는 이전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다. 여전히 7만 명 이상의 정신장애인이 정신병원, 정신 요양 시설에 갇혀 살아간다. 우리나라 전국 교도소에는 수감자 5만여 명이 있다. 이들 중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범들에게도 재판받을 권리는 보장된다. 반면 전국 수감자보다 더 많은 수의 정신장애인은 충분한 법적 보호 장치 없이 인신 구속에 가까운 상태로 병원과 시설에 있다. 그래서 강제 입원, 장기 입원의 병폐가 드러난다. 정신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지내는 동안 지역사회 터전은 점점 더 좁아진다. 지역사회에서 이들은 낯선 존재가 된다. 시설에서 돌아온 정신장애인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 고달픈 현실이므로 다시 시설로 돌아가거나 숨어 지내야 한다. 세상도 이들의 존재를 환영하지 않는다. 시설의 강고함과 지역사회의 황폐함이 서로 맞물리면서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이들을 가둔다.
시대에 따라 수용의 주체나 수용 공간의 외형, 수용 방식이 조금씩 달라질 뿐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국가의 역할도 별 차이가 없다. 민간이 강고한 수용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가는 이를 지원한다. 민간 수용 체계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국가는 외면하거나 소극 대응에 머문다.코로나19 유행으로 정신장애인의 열악한 수용 환경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폐쇄되고 밀집된 환경에서 장기간 수용되어 지내는 현실이 바이러스에 의해 세상에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이런 끔찍한 현실을 사람들이 알기나 했을까?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모습은 과거 100년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이다. 대한민국 정신장애인 수난의 역사 한 단면이 생생하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에게 뉴노멀을 요구한다. 정신장애인에게도 뉴노멀이 필요하다. 그들에게 필요한, 그들이 원하는 뉴노멀은 무엇일까? 과거 100년의 낡은 체제를 벗고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이 뉴노멀일 것이다. 코로나가 지나고 미래에 새로운 바이러스 팬데믹이 도래할 때는 시설에 남은 정신장애인들이 희생되지 않아야 한다.
이탈리아는 이미 40년 전에 ‘바살리아 법’을 제정하고 정신장애인들의 지역사회 복귀를 선언했고 지금도 실천하고 있다.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이는 관심과 의지 그리고 정책의 문제이다. 우리에게는 뉴노멀 모델이다. 이탈리아가 이룬 대전환의 국면에서 국가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외면하고 방치하고 무책임한 모습이 현재 대한민국 정신 보건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국가의 형상이다.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한결같다. 이제 오롯이 국가가 지난 역사의 책임을 다해야 할 때가 왔다.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가 나서 대전환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일제 강점기 이후 100년 넘게 계속된 격리 수용의 낡은 패러다임을 벗고 뉴노멀,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는 데 국가의 역할이 무엇보다 절실하고 중요하다. 참 믿기지 않는다. 관성이라는 게 있다. 국가가 알아서 이 전환의 물꼬를 터 줄까? 무엇보다 절실한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각성과 운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민과 지역사회의 연대와 응원이 필요하다. 한 목소리로 국가의 반성과 성찰 그리고 책임 있는 실천을 요구해야 한다.
잊힌 존재, 투명 인간으로 지내온 세월을 뒤로 하고, 존재를 밝히 드러내며 “여기 우리가 있다”고 외치자. 더불어 사는 세상을 이제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은이 : 백재중
출판사 : 건강미디어협동조합
반양장/148x210mm/176쪽/값 15,000원
ISBN 979-11-87387-16-9
초판 발행일 : 2020년 6월 10일
건강미디어 mediahealth2015@gmail.com